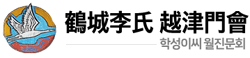이휴정(二休亭) -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
본문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울산광역시 남구 이휴정길 20)
이휴정(二休亭)은 원래 서기1662년 현종 임인년 봄에 성균진사(成均進士) 이동영(李東英)이 28세에 태화강 위 은월봉 아래에 정자(亭子)를 세워 정호(亭號)를 이미정(二美亭)이라 하였다.
암행어사 박세연(直指使朴世衍)이 서기 1666년에 이 곳에 둘러 남긴 글에 의하여(박세연이 남긴 글은 와비에 기재되어 있음) 이휴정이라 고쳐 부르고, 자호(自號) 또한 이휴정으로 정하고는 지혜와 어진 것(지인:智仁)을 힘쓰게 (면:勉)하고 성품과 혼(성령:性靈)을 기르게(양:養) 하였도다.
자손들의 성심과 노력(성력:誠力)으로 울산도호부(蔚山都護府) 학성관(鶴城館)의 남문루(南門樓)를 서기 1940년 경진에 헐게되자 학성이씨 월진문회(鶴城李氏 越津門會)에서 이를 사들여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하여 태화루 현판을 떼어내고 이휴정 현판을 달게 되었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2칸의 익공양식(翼工樣式)을 갖추고 있으며, 중간(中間)은 마루를 만들었고, 두 가장자리는 방(中堂旁室:중당방실)을 둔 형태이다. 지붕은 네 모퉁이에 모두 추녀를 단 팔작(八作)지붕에 겹처마로 이었고, 마루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둘렀다.
이 건물은 1983년 경상남도지정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가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로 승격되면서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문화재자료(蔚山廣域市文化財資料) 제1호로 지정되었다.
2003년 9월 25일 화재(火災)로 소실(燒失)되었으나 옛 설계도를 참고하여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실의 학술조사 보고서에 의거 국비 등 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총공사비 4억 6천 5백만원을 들여 문화재 건축 전문업체인 기화건설에서 건물을 복원하여 2005년 8월에 중건하였으며 단청공사는 구구건설에서 2007년 10월에 완료함으로써 1940년에 세웠던 그대로 복원하여 2008년 4월 20일 복원 낙성식을 갖게 되었다.
⦿서거정이 쓴 태화루 현판은 이휴정에서 소장하다가 현재는 울산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복제본을 용연서원 서재인 온고재에 전시하고 있다.
∙ 서거정(徐居正) : 1420(세종2년)~1488(성종19년).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 자는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문집에 『사가정집(四佳亭集』, 『동인시화(東人詩話)』 등이 있음. 여섯 살 때부터 글을 읽고 시를 지어 신동이라 하였음. 여섯 왕을 섬겨 45년간 조정에서 벼슬을 함. 벼슬은 대제학(大提學), 대찬성(大贊成)을 지냄. 과거 시험관을 23번이나 지내면서 많은 인재를 뽑았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음
이휴정공 이동영二休亭公李東英 와비臥碑
이휴정 경내에 세워진 비
성균원생 이동영(李東英) 부군(府君)의 본관은 학성(鶴城)이요, 자(字)는 화백(華伯)이고, 호(號)는 이휴정(二休亭)이며 조선 중기인 17세기 사람으로 이곳에 세워진 이휴정의 원래 주인이다.
이동영 부군은 충숙공(忠肅公) 학파(鶴坡) 이예(李 藝)의 구세손(九世孫)이며, 조부(祖父)인 난은공 이한남(難隱公 李翰南)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여러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宣武原從) 훈삼등(勳三等)으로 녹봉되고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으로 제수되었다. 인조 13년 을해(1635년)에 월진촌(지금의 신정동 일대)에서 장악원정 이천기(掌樂院正 李天機)의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부군(府君)은 어려서부터 자품이 범인과 달라 재능과 총명함이 뛰어나셨다. 현종 7년(1666년)에 사마시 생원(司馬試 生員)에 급제하였으나 이듬해인 현종 8년(1667년)에 33세의 짧은 생을 살다 가신 대 문장가이다. 이동영 부군의 급제는 임진왜란 이후 학성이씨 월진파(鶴城李氏越津派)를 일신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한편으로 구강서원을 설립하는데 앞장서는 등 유풍(儒風)을 불러일으킨 중심인물이었다.
부군의 후손으로 훌륭한 인재들 중에는 태화당 이광희(李光熹)가 그의 손자요, 어려서부터 그의 기상이 뛰어나 호걸의 기풍을 지녔으며, 문집으로 북정록(北征錄)과 일고(逸稿)가 남아있다.
또한 부군의 증손인 무민당 이여규(无憫堂李汝圭)는 무민당 문집 2권을 남겼다. 이휴정 부군의 생애에는 세 차례의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암행어사 박세연(朴世衍)과의 만남이고, 둘째 허목 미수선생(許穆 眉廋先生)을 모신 일이며, 다음은 괴천박창우공(槐泉朴昌宇公)과의 인연이다.
부군이 문장가(文章家)로서 입지를 높이던 무렵 조부 난은 이한남공이 월진촌에서 영남의 학맥을 이어가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웠던 선례(先例)를 본받기 위해 1662년에 이휴정(二休亭) 자리에 이미정(二美亭)을 지어 기거하고 있던 1664년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암행어사 박세연(朴世衍)이 이 정자를 보고 이르기를
山乎山乎美則美矣可以休矣 (산호산호여 미칙미의라 가이휴의라)
산, 산이여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아름다운 곳이 더욱 아름답고
水哉水哉美則美矣可以休矣 (수호수호여 미칙미의라 가이휴의라)
물, 물이여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아름다운 곳이 더욱 아름답도다.
라고 시를 읊은 것을 따라 1666년에 이미정을 이휴정이라 고치고 부군의 호(號)를 또한 이휴정(二休亭)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허미수 선생과의 만남이다. 부군은 바로 당대 동방의 제일인자란 찬사를 받았던 허목 미수선생(許穆 眉廋 先生) 문하에서 괴천공과 함께 수학하며 깨우침을 이어받았으며 미수 선생의 가르침으로 현종 7년 병오(丙午:1666년)에 생원 급제했던 것이다.
성균생원 이동영은 그 어려운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성균관(成均館)에서 수학한 후 낙향하여 집안을 돌보며 울산지역에서 유풍을 일으키고자 진력을 다하였다. 이때 또 백만 원군이 된 한 분이 있었으니 괴천 박창우공(槐泉 朴昌宇公)이시다. 괴천공은 이휴정 부군과 더불어 사마시(司馬試)에 동방급제(同榜及第)한 분이며 본래 영천 출신으로 밀양 박씨(密陽 朴氏) 밀직부원군의 후손으로 도승지 청풍당선생(淸風堂先生) 휘 영손(英孫)의 후예요, 장사랑(將仕郞) 휘 현(晛) 호 국담공(菊潭公)의 아들이시다. 이휴정 부군의 권유에 따라 1664년 남하하여 울산에 정착하였다. 이를 계기로 괴천공이 울산으로 이거한 후 두 분은 수시로 회합하여 태화강과 이휴정 등지에서 시담(詩談)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구강서원(鷗江書院)을 건립하여 후진 양성에 앞장섰다.
괴천공은 두 분의 관계를 이성지골육(異姓之骨肉)으로 표현하며 생전에 못다 나눈 정을 후손들이 이어 가도록 유훈을 남겼으며, 이 같은 인연으로 345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밀양박씨 송정문중(密陽朴氏松亭門中)과 학성이씨 월진문중(鶴城李氏越津門中)은 강의계(講誼契)를 조직하여 연연세세(年年歲歲) 우의를 다져오고 있으며 양공의 묘제 참배등으로 고을의 미담이 되고 있다.
이동영 부군의 유집으로 이휴정문집(二休亭文集)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문집에는 가훈(家訓)격인 거가요어(居家要語)가 21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모든 일을 순리대로 거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했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을 공경할 줄 알라. 등이 그 내용이다.
또 권학의 뜻을 담은 여덟 가지 독서하는 자세와 방법을 담은 독서규례(讀書規例)는 독서는 반드시 이치를 규명하여 몸소 실천하는 것을 주로 삼고, 처음 뜻을 세울 때는 철석같은 각오로서 임하고,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부귀를 뜬 구름 같이 보아야 하고, 하루에 배우는 것은 백 번 외우고 일 개월 분을 합쳐서 외우라. 배운 글이나 말은 평상시에 자기가 말하는 것같이 자연적으로 될 만큼 외우라는 등의 내용으로 큰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 이동영 부군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어도 후손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에 월진문중후손(越津門中後孫)들은 이곳 이휴정에 대해 강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부군의 산소(溫山三平所在)와 더불어 영구히 보존되기를 희망하면서 온 후손이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2007년 9월 10일
학성이씨월진문회후손(鶴城李氏越津門會後孫)
이휴정 복원 낙성 고유문
회덕 황 진 곤
현(顯)십대조고(十代祖考)진사부군(進士府君)님께 아뢰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이와 같이 위대한 부군님의 지나간 자취와 타고난 자질과 성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탄복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재기(才器)가 뛰어나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시었으며 일찍이 국학(國學)에 나가시어 상사(上舍)의 영예스러우심을 얻으시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벼슬길을 사양하시어 짐을 챙기어 고향에 돌아오시어 경학(經學)에 침잠(沈潛)하시고 태화강 위의 은월산 기슭에 시소점과 거북점을 치시어 좋은 날을 택일하여 몇 칸의 정자를 건축해 놓고 글로써 벗을 모아 시문으로 정담을 나누시며 즐겨하셨고 말과 행동을 잘살피면서 착한일은 드러내고 악한 것은 숨겨 주셨으며 향교와 서원을 설립하는데 도와 주시어 재물을 두텁고 넓게 주셨고 가르침에 부지런하시어 한결같이 바야흐로 풍속을 교화시키셨으니 고을과 마을이 다투어 칭송하며 길가는 사람들도 기리는 말이 이어지더니 돌아가신 뒤에 지극한 정성으로 길이 훌륭하신 자취를 길이 보호하려 하였더니 천만 뜻밖에 화마가 급습하여 순식간에 거의 타 버리고 나머지도 기울어서 여러 후손들이 협심하여 다시 세우기를 도모하여 큰 나무로 재목을 마련하여 견고하게 지어놓고 당에 올라가서 추모하오니 존령께서 오르고 내리고 하실것이니 이 뒤로 못난 자손이 감히 유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히 그 이유를 아뢰옵고 공경히 맑은 술을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시옵소서
이휴정二休亭과 괴천槐泉 공의 친교親交
괴천공(槐泉公)의 휘(諱)는 창우(昌宇), 자(字)는 여인(汝寅), 호(號)가 괴천(槐泉)이다. 관향(貫鄕)은 밀양박씨(密陽朴氏)인데 누대로 송정(松亭)에 세거 하였기 때문에 이 고을 사람들은 이 일문을 속칭 송정박씨(松亭朴氏)라고 한다. 이 일문이 맨처음 울산에 이거해서 뿌리를 내리게한 입향조(入鄕祖)가 되는 분이 바로 이 분이다.
송정박씨(松亭朴氏)가 이 고을에 이주해 온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선 그 本人이 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남이록(南移錄)』을 소개한다. 괴천공(槐泉公)은 조선 인조 14년(1636년), 영천에서 태어나서 고향인 그 곳에서 줄곧 살아오다가 28세가 되던해. 즉 현종5년(1664년)에 울산(蔚山)으로 이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사마시(司馬試 生員進士 : 小科)에 급제하였고, 그 뛰어난 학문으로써 우리 고을의 문흥에도 힘을 써 왔으니 공의 시와 문장 속에는 오늘날 우리 향토사적(鄕土史蹟) 자료가 될 만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선 다만 괴천공(槐泉公)이 울산으로 이주해온 내력을 직접쓴 남이록(南移錄)을 번역해서 싣는다.
아! 나는 永川사람 이다.
내가 만약을 말하지 아니하면 비록 내 子孫 일지라도 우리 一家가 남쪽 고을인 蔚山으로 내려오게 된 내력(來歷)을 어찌 알 것인가. 지난날 나의 할아버지 죽재공(竹齋公)께서 늙고 쇠했을 적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시어, 온 家族을 솔권하여 선영(先塋)의 숲골인 괴하동(槐下洞)의 독서당(讀書堂)에 숨어서 지내셨는데 8년 후에야 비로소 나라가 평시로 회복되었다. (중략) 아! 우리 집안은 유학(儒學)을 세업으로 삼아왔는지라 선인(先人) 백씨(伯氏)·중씨(仲氏)·숙씨(叔氏) 세분이 모두 문장이 뛰어나고 행의(行義)가 돈독(敦篤)하셨으며 백부(伯父)이신 오졸자(吾卒子) (휘 暾)先生은 일찍이 생원(生員)의 수석에 급제하심에 연방(蓮傍)에 등재되어있다. 불행하게도 임고서원(臨皐書院)의 병배분쟁(幷配紛爭)을 뜻밖에 만나 집방(執方)하고 경계하며 지키려는 의리를 의연하게 싸움을 시작하여 풍파에 지주(砥柱)로 힘써 사고는 마침내 귀정되니 세론으로 사림에서 영수로 추대되셨다. 그러나 상화(喪禍)가 연이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었다.
선고(先考)이신 국담공(菊潭公)은 능서랑(陵署朗)으로 천거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시지 않으셨고, 숙고(熟考:돌아가신 숙부)이신 매산공(梅山公)은 출계(出系)하여 종가를 이어 곧 대암선생(大庵先生)의 사자(嗣子 :대를 이을 맏아들)가 되셨다. (중략)이에 갑진년(甲辰年 : 顯宗 5年, 1664년) 봄에 강남(江南 :여기서는 남쪽 고을이란 뜻)에 가서 살 계획으로 울산방면(蔚山方面)으로 남하(南下)하던 길에 마침 월진(越津 : 지금의 신정1동)에 사는 이동영(李東英 :號는 二休亭, 字는 華伯)을 만났더니 화백(華伯)이 내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만약 그대 가정을 우리 고을로 옮긴다면 그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뜻이 같아 일정을 굳게 약속하고 중도에서 그는 곧 말머리를 돌려가고 나도 역시 말을 타고 저녁 무렵집으로 돌아와서 가인(家人 : 처자와 권속)과 의논하니 내자(內子)가 말하기를 『내 장차 영천을 떠날 것이니 친정의 사당(祠堂)에 작별의 인사를 아니하고 넘어가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전일에 약속한 대로 內子를 가마에 태워 행장을 차려 떠나 보내고 가구 집기(家具 什器)는 단속하여 세바리 짐을 싣고 감실(龕室 : 사당안에 신주를 모시어 두는 장)은 수레에 안치하여 두 명의 종을 따르게 하여 아와역(阿火驛)을 지나 모량점(侔梁店:지금의 모량리)에 다다르니 윤익창(尹益昌), 이화백(李華伯), 이하경(李夏卿) 세 사람이 화산 월진(越津)의 노마 십여 쌍을 거느리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누어 실을 물건이 없어 빈말로 돌아와 구어역(九於驛)에 이르러 저녁을 먹고나니 밤이 이미 삼경이요 달은 이미 중천에 떠올랐다. 이때 화백(華伯 :李東英의 字)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거 할 집까지는 불과 이십리 남았으니 달빛 아래 곧장 가는 것이 어떻겠소』하고 묻기에 나는 좋다고 말을하고 재촉하여 안신내(內新溪)에 이르니 정침(正寢)과 행랑(行廊)채는 모두 여섯 문이며 묘실(廟室)은 더욱 정결하였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곡식은 서른 꾸러미나 되었고, 옹기그릇과 여러 물건들은 곳곳에 으리으리하게 놓여있었다.
이듬해 을사년(乙巳年:顯宗6年,1665년) 2월에 외람되고 욕되게도 본 고을의 향교(鄕校)일을 맡고, 朴어른이 이 방면에 밝다고하여 이동영(李東英), 김종휘(金宗揮)가 함께 오더니 함께 손을 잡고 사당에 들어가서 분향(焚香)하고 공자(孔子)님의 신위(神位)에 참배하였다. 그리하여 향교 규칙의 조목에 대하여 상의도하고 한편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창건하여 포은(圃隱)선생과 회재(晦齋)선생의 神主를 모시고자 의논을 하였으나 서원을 세울터가 여러번 변경되고 그 역사가 워낙커서 첨현(僉賢)들이 성의를 다할지 염려되었다.이듬해 병오년(丙午年:顯宗7年, 1666년)봄에 화백 이동영(華伯 :李東英)과 더불어소성(小成:小科가운데 초시나 경시)에 참여하여 함께 급제하였다.
마침내 집안의 변고로 장빈(漳濱 : 병을 얻어 요양을 해도 죽음이 가깝다는 말)에 누웠는데 거기에 또 처상(妻喪)을 당하여 고향산천 두예동(杜乂洞)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숙부(叔父) 및 종형제(從兄弟)들과 함께 선인의 유업을 따라 담장이 잇닿는 곳에 살기로 기약하였으니 이륜(彛倫 :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도리)을 두텁게하여 우리 집안을 추락시키지 말고 효우(孝友)를 행하여라.
아!사람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어려움은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뒤집어 추락하기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음을 대개 내눈으로 보았고 몸소 가난하게 살다가 고향을 떠나온 고통을 생각하여 교만하고 사치하여 가문을 뒤집어 추락하지 말라. 내 나이 이미 57세(肅宗18年,壬甲1692년) 이다. 이후 온 집안의 경영(經營)은 너희 형제(兄弟)의 말을 들을 것이니 너희들도 힘쓸지어다.